티스토리 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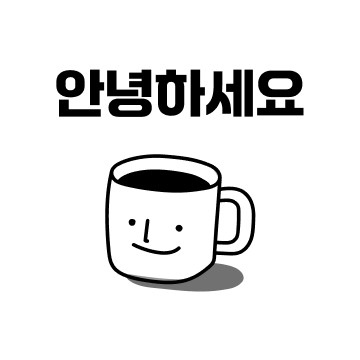
부동산과 경제 공부로 '현금 흐름, 500만'을 꿈꾸는 머니오백연구소팀장, 해뜬날입니다.
2022~2025년 외국인 집주인 전세 보증사고 103건, 243억원 피해 발생. HUG 대위변제 160억원 중 회수액은 3억 3천만원(2%)에 불과. 중국인이 27명으로 최다(84억원). 43명 중 22명은 연락두절 상태. 외국인 부동산 투자는 2년간 60% 급증했으나 관리 시스템은 전무한 실정이다.
◆ 출처 자료 바로가기 ◆

"회수한 돈은 고작 2%입니다"
2025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자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단 4년 사이, 외국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가 무려 103건, 피해 금액은 243억원에 달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회수율이었습니다. HUG가 세입자들을 대신해 보증금을 지급한 금액이 160억원. 그런데 외국인 집주인들로부터 실제로 회수한 돈은? 고작 3억 3천만원. 회수율 2%입니다. 나머지 157억원은 사실상 날아간 겁니다. 그것도 국민 세금으로 메워진 돈이죠. HUG 담당자가 10월 초 외국인 임대인 43명에게 전화를 돌렸지만, 통화가 된 사람은 단 6명. 그마저도 모두 "돈이 없어서 못 갚겠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중국인이 압도적 1위입니다"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외국인 임대인 43명의 국적을 분석하자 명확한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중국인이 27명으로 압도적 1위. 회수하지 못한 금액만 84억 5천만원입니다. 전체 미회수 금액의 절반이 넘는 수치죠. 2위는 미국인 8명(53억 1천만원), 그 다음이 캐나다 2명, 일본 2명 순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중 22명이 완전히 연락두절 상태라는 점입니다. 법원이 지급명령서를 보냈지만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결국 공시송달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 게시판에 공고문을 붙이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찾을 수 없으니 그냥 형식적으로 통지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이미 본국으로 돌아갔거나, 한국에 있더라도 의도적으로 잠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림동의 D씨처럼 말이죠.
"외국인 부동산 투자, 폭발적으로 증가 중"
이런 사태의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급증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가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여 소유권 이전까지 마친 외국인이 1만 5,614명. 이 중 중국인이 1만 157명으로 무려 65%를 차지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차 계약 건수도 1만 7,786건으로 2010년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죠.
더 놀라운 것은 증가 속도입니다.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는 2022년 4,568건에서 2024년 7,296건으로 단 2년 만에 60% 급증했습니다. 2024년 7월까지의 거래량만으로도 이미 예년 수준을 뛰어넘어, 연말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집주인들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보증금을 가지고 본국으로 떠나버리면 사실상 속수무책인 것이죠.
"관악구만 100억, 전국은 얼마나 될까"
1부에서 소개한 신림동 D씨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같은 관악구에서만 중국인 및 귀화 중국인 집주인들이 일으킨 전세 사기가 줄줄이 터져나왔습니다. 신림동의 현타워 귀화 중국인 G씨(21억원), 봉천동 골하우스의 중국인 H씨, 그리고 또 다른 귀화 중국인이 일으킨 39억원 규모 사기까지... 확인된 것만 다타워, 현타워, 골*하우스 등 3곳에서 49가구가 피해를 입었고, 보증금 총액은 67억원을 넘었습니다. 여기에 39억원 사건까지 합치면 관악구만 100억원이 훌쩍 넘습니다.
더 섬뜩한 것은 이 건물들의 공통점입니다. 건축사사무소가 모두 같고, 공사 시공업체도 동일하며, 건물 외관까지 거의 똑같습니다. 일부 세입자는 "집주인들끼리 서로 아는 사이이거나 최소한 친척 관계일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마치 조직적으로 계획된 범죄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관악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 곳곳에서, 경기도에서, 인천에서...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HUG에 집계된 103건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만 포함된 수치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신고조차 하지 못한 피해자들까지 합치면 실제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왜 선량한 세입자들이 이런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외국인 집주인에게는 어떤 제도적 허점이 있고,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연재]
- 3부: 나는 안 당할 수 있을까? 외국인 집주인 체크리스트 (다음 편)
📌 관련 글 보기: 23억 원과 함께 사라진 집주인... 신림동에서 일어난 일


'부동산과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부 "10년 전 통장까지 들여다본다" 국세청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감시 시대 (0) | 2025.11.09 |
|---|---|
| 3부: 왜 당할 수밖에 없었나? 외국인 전세 사기 예방법 (0) | 2025.11.08 |
| 23억 원과 함께 사라진 집주인... 신림동에서 일어난 일 (0) | 2025.11.06 |
| 월급 10% 넣었더니 노후 월 300 자동 생성 (0) | 2025.11.05 |
| ⚠️ 감정가 139% 고가 낙찰 속출, 지금 서울 경매 뛰어들면 안 되는 이유 (0) | 2025.11.04 |


